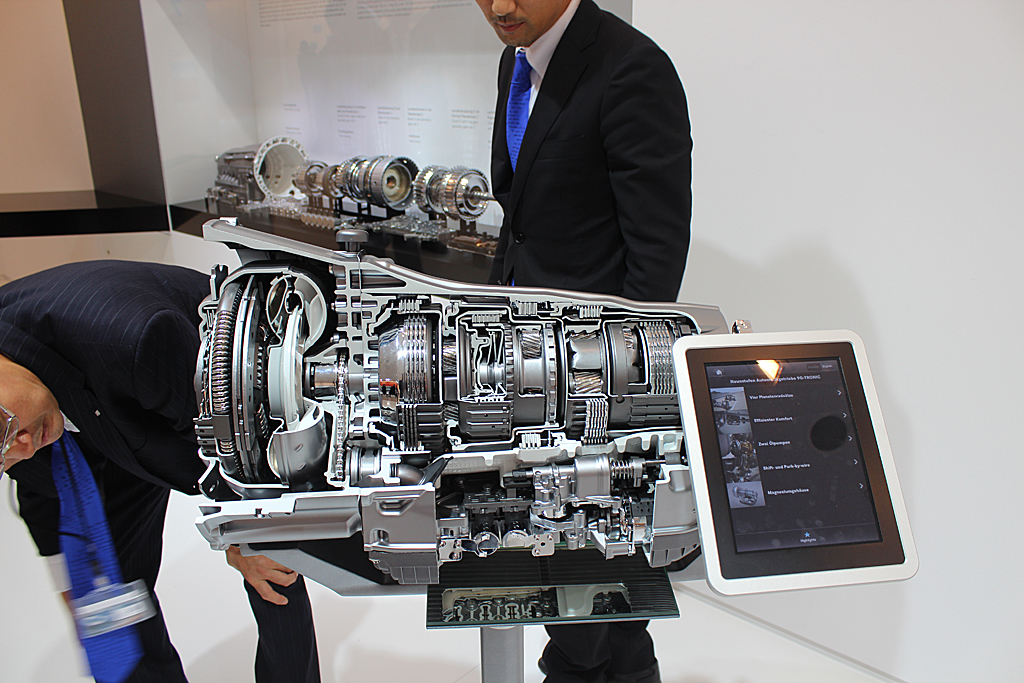자동차 업계는 한 숨은 돌린 상태다. 이미 2015년의 규제에 근접할 정도의 효율 향상을 보여주고 있다. 단순히 수치이던 아니던 크게 낮아진 CO2 배출량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근 몇 년 사이 다운사이징 엔진으로 열심히 달려왔다면 이제는 하이브리드와 전기차를 이용해 새 규제를 준비 중이다.
최근의 자동차 업계는 내연기관의 효율을 올리는 다운사이징 엔진에 주력해 왔고 실제로도 큰 실효를 거뒀다. 경제 위기 이전에 대두됐던 유럽 평균 CO2 배출량은 자동차 업계에 여러 가지 트렌드를 불러 일으켰다. 가장 큰 게 앞서 얘기했던 다운사이징 엔진이다. 다운사이징 엔진에서는 과급기가 필수인데 특별한 기술이 아니다. 예전부터 사용하던 기술이지만 시대의 요구에 맞게 성격이 변화한 것이다.
지금의 다운사이징 엔진은 최신의 가변 터보와 직분사 시스템이 더해지면서 연비는 물론 출력까지 좋아진다. 최근 몇 년 사이 전기차보다 내연기관의 효율 향상이 더 두드러진다. 전기차는 본격적인 양산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리프부터 거의 대부분 모델이 주행 거리 160km 내외였고 5~6년이 지난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다. 반면 내연기관 모델은 연식 변경이 될 때마다 연비가 몇 퍼센트씩 좋아진다. 2000년대 초반에 가솔린 엔진은 더 이상 발전이 힘들다는 예상을 생각해보면 아이러니한 일이다. 반대로 얘기하면 결국 궁하면 통하는 것이고 자동차를 개발하는 사람들의 능력이 좋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이유는 현재 가용이 가능한 기술의 유무이다.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는 자동차 메이커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고 쉽게 발전이 힘들다. 반면 내연기관은 오랜 노하우에 최신 기술을 발전시켜서 효율 향상을 일궈내고 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는 당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장밋빛 청사진이나 이미지도 좋지만 당장의 발등도 중요하다.
발등의 불은 규제이다. 유럽은 평균 CO2 배출량을 맞춰야 한다. 이를 위해서 2008년을 전후로 많은 저 CO2 버전이 선보였고 내연기관의 효율 향상도 가속화 됐다. 자동차 회사들이 노력한 것은 수치로 나타난다. 이미 유럽에서 팔리는 신차는 CO2 규정에 거의 근접해 있다.
최근 발표된 T&E(European Federation for Transport and Environment)의 발표에 따르면 작년 유럽 신차의 평균 CO2 배출량은 132.4g/km이다. 이는 2015년의 규정을 거의 만족하는 것이다. 2015년에는 평균 CO2를 130g/km 이하로 낮춰야 하고 이미 토요타와 볼보, 르노는 만족했다. 그리고 올해에는 BMW와 GM, 포드, 폭스바겐, 현대도 2015년 규정을 맞출 전망이다. 예상을 뛰어넘는 페이스이며 당초 규정이 느슨하다는 주장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는 상황이다.
규정은 점점 강화되는 게 당연한 수순이고 따라서 2015년 이후의 환경 규제라는 숙제도 남아있다. 2020년에는 평균 CO2 배출량 규정이 95g/km까지 낮아진다. 그리고 꼭 규정이 아니더라도 차를 팔아야 한다는 절대 명제가 있다. 신차 시장의 상황이 좋을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지금은 당장 판매가 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해서 파는 것이 당연하다.
반대로 더 강화되는 규제를 고려하면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같은 친환경 기술에 투자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역시도 같은 논리로, 하이브리드나 전기차가 궁극의 파워트레인이라서가 아니라 전체 CO2를 낮추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전기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전체 CO2 감소에 크게 도움이 된다. 브랜드의 이미지 재고는 그 뒤에 따라오는 보너스 같은 것이다. 따라서 자동차 메이커들은 발등의 불이나 새 친환경 기술을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와 미래 기술의 개발은 언제나 있어왔지만 지금은 좀 더 상황이 빡빡하다는 게 다른 점이다.
![[모터리언] Motorian](http://www.motorian.kr/wp-content/uploads/2013/05/aMotorianNWT-1-280-80.jpg) [모터리언] Motorian 자동차의 모든것
[모터리언] Motorian 자동차의 모든것